
정부는 2023년 6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흔히 '디지털 국토 전략'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인공지능(AI), 위성정보, 자율주행 기술 등을 바탕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다루는 공간은 주로 도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계획서에 어촌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책 항목이나 실행 프로그램에서 어촌은 일관되게 주변부에 놓여 있다. 어촌의 고유한 현실과 필요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자동 포함된 공간'으로 간주된 인상이 강하다.
그 결과 디지털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접근이 어려운 어촌은 또다시 전략 외곽에 머물게 됐다. 대다수 어촌은 여전히 의료, 돌봄, 교통, 교육, 주거 등 기본 인프라조차 충분치 않다. 2023년 기준 농어촌의 평균 고령화율은 55.8%, 빈집률은 14.4%에 이른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 기반과 관계망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 기술만 덧붙인다고 해서 전략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센서와 드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위급 상황을 감당할 응급 체계나 돌봄 네트워크가 없다면 디지털화는 '전시용 프로젝트'에 머물 뿐이다. 기술보다 앞서 설계돼야 할 것은 사람의 일상이다. 데이터보다 돌봄, 플랫폼보다 병원 접근성이 더 시급한 곳이 바로 어촌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추진한 '콘티키(Kontiki) 프로젝트'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고령 인구가 집중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직업 전환, 지역 교통을 통합 제공한 노르웨이 고령복지 디지털 실증 모델이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회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우리 어촌도 의료와 교통, 돌봄의 기반부터 디지털로 엮는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어촌을 정책 실험의 후순위가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에 둘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스마트양식, 해양바이오 산업은 사람 중심이 돼야 지속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실증 기반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실행 주체로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과 데이터가 순환하는 통합형 디지털 운영 시스템이다. 실행 주체가 따로 놀고, 데이터는 쌓이지만 주민이 배제되는 방식으로는 전략이 작동할 수 없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계·운영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지도는 중심에서 그려지지만, 변화는 외곽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늦게 도달한 공간이 가장 먼저 설계될 때, 진짜 전략이 작동한다. 어촌은 더 이상 보완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 국토 전략의 실효성을 가늠할 출발점이 돼야 한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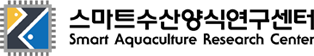











 Total article : 54
Total article : 54
